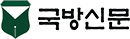‘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 ‘경제의 마에스트로’ 앨런 그린스펀, ‘헬리콥터 벤’ 벤 버냉키, 제롬 파월.
이들은 ‘미국의 경제 대통령’ 나아가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까지 불린 미국 중앙은행 총재들이다. 1980년대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 2000년대 초 소위 ‘신경제’ 구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 중앙은행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제뉴스의 관심 대상 1번지다. 그런데 미국 중앙은행에 대하여 언론, 책자, 자료, 인터넷, 유튜브 등에는 잘못된 명칭, 오해, 왜곡, 사실이 아닌 내용, 음모론까지 난무하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왜 ‘제도’라고 부를까,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왜 ‘이사회’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왜 ‘의장’이라고 부를까, 총재들이 왜 그리 많을까, 중앙은행이 자그마치 12개나 될까, 도대체 민간기관이 달러를 발행하는가, 월가 금융기관이 좌지우지하는가 등 유달리 많은 논란이 있다.
필자는 90년대 말 미국에서 MBA 과정을 수학하면서 워싱턴DC에서 한 달 동안 미국 정부 시스템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수강한 적이 있다. 중앙은행 Fed도 방문하고 통화정책의 심장부인 FOMC 회의실을 둘러보고 의장석에도 앉아 보았다.
또 2000년대 초반 워싱턴 주재원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과 두루 교류했다. 그간의 경험과 법적 자료 등을 토대로 팩트체크를 하고자 한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18세기 말 여러 논란 끝에 The Bank of the United States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두 차례 총 40년간(1791~1811, 1816~1836) 한시적으로 인가되어 운영된 후 폐업되었다.
20세기 초 금융위기가 재발하자 월가 은행을 중심으로 중앙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고 정치권과 타협하면서 1913년 Federal Reserve Act 법이 제정돼 중앙은행 체계가 마련되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Federal Reserve System으로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의 기관이 아닌 여러 기관으로 이루어진 연합체다. 주요국의 중앙은행으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일본은 ‘일본은행’, 중국은 ‘중국인민은행’(‘중국은행’은 상장된 상업은행임), 영국은 ‘Bank of England(BoE)’, EU는 ‘European Central Bank(ECB)’ 등이며, 이들은 모두 단일 기관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정부기관인데, 한국은행은 정부기관이 아닌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사실상 공공기관이다. 일본은행은 주식회사로 상장회사이기도 하며, Bank of England(BoE)는 주식회사이지만 국유화되었다. ECB는 회원국 중앙은행이 출자한 사실상 공공기관이다.
국가별 법적 체계와 상황에 따라 중앙은행의 법적 형태도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으로서 중립성과 전문성이 법적으로 잘 보장되고 운영되느냐이다.
첫째, Federal Reserve System을 기관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기관의 명칭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중앙은행 시스템’을 일컫는 말이다. 공식적으로 줄여서 ‘Fed’ 또는 ‘Federal Reserve’라고 부르고 있다.
국내 언론, 관계기관에서 ‘연방준비제도’라고 쓰고 있는데, 과거 일본은행이 번역해 쓰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다. 그러나 영어 본래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준비’와 ‘제도’라는 용어가 번역상 정확하지 않고 뉘앙스가 사뭇 다르다.
어색하고 부적합한 용어를 쓰기보다는 그냥 ‘미국 중앙은행 Fed’라고 하면 가장 적절하다. 언론에서 ‘연준’으로 줄여 쓰고 있는데 일반 대중들에게는 의미전달이 안 되고 낯설다. 차라리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쉽다.
Federal Reserve System을 운영하는 기관은 상부기관이며, 독립행정기관인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이하 줄여서 ‘Board’라고 함), 집행기관으로 주식회사이나 사실상 공공기관인 12개의 Federal Reserve Banks(이하 줄여서 ‘Banks’라고 함), 그리고 기준금리와 공개시장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로 구성된다.
더 간략히 얘기하면, 상부기관이며 정부기관인 Board와 산하기관이며 민간기관인 Banks로 이루어진 유기적 연합체다. 이들의 관계는 본청과 지청 또는 본사와 지사 정도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자세한 관계는 2편에서 살펴보겠다.
둘째로, Fed의 대표기관인 Board(위원회)를 한국은행을 비롯한 관계기관, 언론, 나아가 국립국어원에서까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명칭이고 일제 잔재다.
미국의 행정부는 크게 백악관, 각 부처, 부처 내 소속기관, 부처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independent agency)으로 구성된다. 백악관 서쪽, 국무부 옆에 있는 Board는 독립기관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Board는 7명의 위원과 이들을 보조하는 약 3000명의 직원이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재무부와는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지만 상호 존중하는 독립된 지위이다.
언론 보도에 미국 중앙은행 Fed라고 보여주는 건물이 바로 이 기관의 청사 건물이며, 현재 제롬 파월(Jerome Powell)이 바로 이 기관의 長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기관이 바로 이 기관이다. 즉, 미국 중앙은행 시스템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본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파월이 Fed 위원장이고 미국 중앙은행 총재이다.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법적으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내부기관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이사회’를 생각해보면 된다. 그런데 어떻게 연방 정부기관에 ‘이사회’라는 명칭이 붙었을까. 더군다나 기관 공식 명칭에 그러한 단어가 없는데도 말이다.
일본은행의 보도자료 등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아마도 처음 번역했을 당시 Federal Reserve System을 기관으로, Board를 그 이사회쯤으로 오해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회’ ‘이사’ ‘의장’이란 용어를 썼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사용했을 것이고 아직도 쓰고 있다. 잘못된 명칭이 관행으로 굳어진 것인데, 일제 잔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색하고 부정확한 명칭인 ‘준비’와 ‘제도’도 그렇게 생겨난 것이다.
미국 행정체계와 기관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아쉽지만 ‘연방준비위원회’가 그나마 적절하다. 이사회가 아니므로 ‘이사’나 ‘의장’의 직함도 맞지않다.
Board의 ‘위원’(공식 직함은 governor이며 board member라고도 함)이며, Board의 長이므로 ‘위원장’(chairman)이 적합하다. 기관의 법적 성격이 비슷한 우리나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조직과 직함을 비교해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외국기관의 성격이나 명칭, 기능, 직함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외교상 실례를 범할 수 있고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오죽했으면 10여 년 전 모 경제부총리가 Board의 명칭과 직함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을까.
일제 잔재에서 비롯된 부적합하고 잘못된 명칭들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 씁쓸하고 안타깝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고, 더욱이 일제 잔재여서 일소해야 한다. (2편에 계속)
<최윤곤 전 금감원 국장 약력>
- 금융감독원 33년 근무
- 자본시장조사국장, 기업공시제도실장, 광주전남지원장, 금융교육 교수 등 역임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University of Texas MBA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