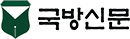[국방신문=김한규 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강원지역(춘천시 북산면, 인제군 서화리 일대)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두 명의 신원을 각각 고 김성근 일병, 고 조창식 하사로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두 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2000년 4월 유해발굴을 위한 첫 삽을 뜬 후 총 160명이다.
이번 고인들의 신원확인은 최근에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유단은 과거 유해발굴 자료 재분석과 병적자료를 기초로 한 유가족 찾기 활동을 통해 유전자 시료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원확인은 국유단 탐문관들을 통해 채취된 고인의 아들과 조카 유전자 시료를 유해와 비교한 결과, 가족관계가 밝혀졌다.

◇ 고 김성근 일병은 국군 제 6사단(추정)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춘천-화천 진격전(1950.10.4∼10.8.)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춘천-화천 진격전은 중부지역의 38도선 돌파 및 진격작전으로 낙동강 방어전선인 영천에서부터 국군이 춘천-화천을 거쳐 북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투다.
고인이 전사한 지 60년이 지난 후 허벅지 뼈 등 부분 유해와 수저, 단추 등 유품이 후배 전우들에 의해 수습되었다.
고인은 1928년 10월 27일 부산 초장동 일대에서 1남 2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던 가정에서 장남의 역할을 다하며 살다가 배우자를 만나 혼인한 후 1949년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고인은 아내와 갓 돌이 지난 3대 독자 아들을 남겨 둔 채 국가를 위해 참전하였고 아내는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전사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다.
고인의 아들 김홍식(73) 씨는 “아버지 유해를 찾았다고 듣긴 했지만 서러움이 한 번에 밀려오기도 하고,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서 편히 모실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 고 조창식 하사는 국군 제 8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며, 강원도 인제 서화리 일대에서 발생한 노전평 전투(1951. 8. 9. ~ 9. 18.)에서 전사했다.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제1차 휴전회담이 열렸으나 유엔군사령부와 공산군(북한·중국군)은 회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전평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 서화리 축선과 인접한 고지군을 점령하기 위한 요충지로 전투는 전형적인 고지쟁탈전이었다.
치열한 전장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다 전사한 고 조창식 하사는 안타깝게도 66년이 지나서야 머리뼈와 윗 팔뼈 등 유해와 전투화 등의 유품이 후배 전우들에게 발견되었다.
고인은 1928년 12월 2일 충북 괴산군 문광면 일대에서 4남 중 셋째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농업에 종사하는 맏형을 도와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갔다. 청년 시절 고인은 건장하고 성격이 호탕해서 동네에서 리더역할을 많이 했다고 한다.
고인은 23살이 되던 해 결혼도 하지 못한 채 국가를 위해 참전하였으나,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려줬다.
고인의 조카 조철주(73) 씨는 “셋째 숙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았는데 유해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후손들에게 숙부를 비롯해 6·25전쟁 기간 중 나라를 위해 전사하신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정확히 알려주고 싶습니다”고 심경을 밝혔다.
국유단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신원확인 결과 통보를 위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2월에 거행하고, 이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해 소재 제보나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 1577-5625(오! 육이오)로 하면 된다.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소정의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