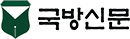[국방신문=송국진 기자]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2차 시험비행이 성공함에 따라 한반도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력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방부는 30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고체 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성능검증을 위한 첫 시험발사에 성공한 지 9개월 만이다. 앞서 작년 7월에는 고체 연료 추진기관에 대한 연소시험에 성공한 바 있다.
국방부는 “우주안보·경제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이번에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발사체를 비행시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발사는 지난 3월 30일 비행시험의 후속 시험으로, 향후 몇 년간 개발과정을 거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우리 군은 우주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험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오후 6시께 진행됐다. ADD는 당초 26~29일 중에 시험비행을 할 예정이었으나 조업 중인 중국 어선으로 인해 30~31일로 항행경보를 변경한 후 이날 시험에 성공했다.
이날 발사된 발사체는 목표로 했던 450㎞ 고도까지 도달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이날 시험에서는 첫 시험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형 고체 추진기관,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Upper stage) 자세제어 기술을 확인했으며 추가 기술 검증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하단인 1단 분리 시험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개발이 상당히 진행돼 이런 속도라면 내년 중에 1단을 포함해 위성을 탑재하고 시험발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2차 시험 성공은 과거 고체연료 기반 발사체 사용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료되면서 국방부와 ADD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다.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는 액체추진 방식보다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인공위성들을 지구 저궤도로 쏘아 올리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이다. 또 액체연료와 달리 사전에 주입할 수 있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기관은 소형위성이나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에 사용된다.
이를 활용하면 우주산업의 상업성이 높아지고 군사 정찰용 저궤도 소형위성이나 초소형 위성 등을 다량으로 발사할 수 있다. 개발에 최종 성공하면 군의 감시정찰 강화와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북한의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등 북한 전력의 움직임을 손금 보듯 파악해 ‘킬체인’의 핵심인 탐지와 조기경보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 30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당시 1차 시험발사에서는 우주발사체 필수 기술인 대형 고체 추진기관(엔진),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 자세제어 기술 검증 등이 이뤄졌다.
국방부는 당시 시험발사 성공을 밝히며 “최근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에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시험발사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군 당국은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ADD를 방문했을 때 30일 진행될 시험 비행 계획을 미리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ADD 방문 자리에서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비대칭 전력이 조기 확보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사는 최근 북한이 연이은 도발과 함께 정찰위성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개발 상황을 알리면서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응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정찰위성 개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북한은 군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 기구로 찍었다는 서울과 인천 사진을 공개하면서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