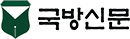오랫동안 우리 시장을 짓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주요국보다 저평가된 현상을 일컫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 애널리스트가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10~2017년 오랫동안 코스피 지수가 1700~2200p 사이에 갇혀 소위 ‘박스피’라는 오명이 씌워지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증시에 깊이 각인되었다.
2021년 코로나 사태 와중에 극적으로 3000선을 돌파하여 드디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듯했다. 이도 잠시, 2022년 다시 박스피 근처로 내려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고질병처럼 우리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다.
2022년 9월 15일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방의 상징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도 30년 만에 폐지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남북관계 등 지정학적 위험, 재벌구조에 기인한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낮은 배당성향, 회계 불투명성, 높은 무역의존도 등이 단골 메뉴처럼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실제로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어 제값을 못 받는 것일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주로 선진국이나 신흥국에 비해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Book-value Ratio)과 주가수익비율(PER, Price Earning Ratio)이 근거로 제시된다.
주가(price)는 기업의 가치(value)를 토대로 시장에서 투자자의 매수·매도에 의해 결정된다. 단기적으로는 사고파는 세력 간에 혈투가 벌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가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
기업의 가치는 크게 보아 자산 또는 이익으로 평가한다. 자산은 특정 시점을 기준(stock 개념)으로, 이익은 일정 기간을 기준(flow 개념)으로 산정하는 수치다. 저성장 기업은 자산이 중요하지만, 고성장 기업은 이익을 보다 중시한다.
자산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보통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치를 사용한다(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순자산). 이를 활용한 지표가 바로 주가순자산비율(PBR)로 주가를 주당(株當) 순자산가치(BPS, Book-value Per Share)로 나누어 산정하며 단위는 ‘배(倍)’로 표시한다. 시장 PBR은 시장의 시가총액을 시장의 순자산총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예를 들어, 주당 순자산가치가 1만원인데 주가가 2만원이면 PBR은 2배가 된다. 만약 주가가 5000원이면 PBR은 0.5배가 된다. 주가가 주당 순자산가치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주가가 저평가되고 너무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회사의 미래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낮다고 평가하여 결과적으로 PBR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은 후 주주에게 나눠주면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 기업이라는 게 회사가 망하여 청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계속기업(going concerns)’ 개념이 바탕에 깔려있다.
더욱이 재무제표에 계상된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처분하여 받을 수 있는 가치, 즉 청산가치를 사전에 추정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전문가의 추정치에 불과하고 실제로 팔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증권거래소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말 삼성전자 주당 순자산가치는 4만3611원(2021 회계연도 수치)이며 주가는 5만5300원으로 PBR은 1.27배다(2021년 말은 1.99배). 코스피 전체로는 2020년 말 1.16배, 2021년 말 1.14배, 2022년 말 0.84배다.
참고로 증권거래소는 개별종목 PBR·PER 계산을 위한 주당 순자산가치·주당 순이익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가 대부분 3월 말에 제출되므로 5월 첫 영업일에 1년에 한 번 수정 반영한다. 시장 PBR·PER 계산을 위한 순자산총액·순이익총액은 분기·반기·사업보고서가 제출되면 약 2주 후 1년에 네 차례 수정 반영한다.
이익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과거에 벌어들인 실제 이익이나 미래에 벌어들일 추정 이익을 사용한다. 이를 활용한 지표가 바로 주가수익비율(PER)로 주가를 주당 순이익(EPS, Earing Per Share)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배(倍)’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주당 순이익이 1만원인데 주가가 10만원이면 PER는 10배가 된다. 시장 PER는 시장의 시가총액을 시장의 순이익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PBR은 과거에 투입된 자본과 적립된 이익의 합계인 순자산가치(분모)로 계산되어 비교적 배수가 낮다. 반면 PER은 1년간의 이익(분모)만으로 계산되어 배수가 훨씬 높다. 더욱이 주가(분자)라는 게 훨씬 기간이 긴 ‘미래의 이익’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PER이 PBR보다 대체로 높다.
미래의 이익이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과거 순이익으로 계산되는 과거 PER(Trailing Twelve-Month PER, TTM PER)보다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이익 전망치 평균으로 산출되는 12개월 선행 PER(Forward twelve-month PER)을 많이 활용한다.
증권거래소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말 삼성전자 주당 순이익은 5777원(2021 회계연도 수치)이며 주가는 5만5300원으로 PER는 9.57배인데 이는 과거 실적 기준 PER이다. 전망치 기준으로는 당시 삼성전자 선행 주당 순이익은 3493원으로 선행 PER는 15.83배다.
코스피 전체로는 2020년 말 29.47배, 2021년 말 12.72배, 2022년 말 10.76배다. 2022년 말 코스피200 지수 선행 PER는 11.39배다.
애널리스트는 PBR이나 PER을 이용하여 목표주가를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에 대하여 본인이 추정한 주당 순자산가치, 예를 들어 5만원에, 본인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PBR, 예를 들어 1.7배를 적용하여 12개월 목표주가 8만5000원, 매수의견을 제시한다.
PER로 목표주가를 제시하는 경우 본인이 추정한 주당 순이익, 예를 들어 5000원에, 본인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PER, 예를 들어 16배를 적용하여 12개월 목표주가로 8만원, 매수의견을 제시한다.
이익 추정은 애널리스트의 축적된 노하우로 경제·산업별 전망을 토대로 사업부별·제품별, 가격·수량·매출액·이익률 등을 예측하고 복잡한 엑셀 작업을 통해 주당 순이익을 추정한다. 소위 ‘멀티플(multiple)'이라 일컫는 PER를 몇 배를 부여할 것인가는 애널리스트 본인의 주관적이고 전문적인 고유 영역이다.
선행 PER는 애널리스트가 여러 가정과 전망에 기초하여 산출한 이익 추정치를 토대로 산출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망이 바뀌어 이익 추정치를 수정하고 주가도 변동되므로 선행 PER는 매우 가변적이다.
종목별 또는 시장 전체 PBR이나 선행 PER을 시계열 흐름으로 분석하여 현재 비율이 역사적으로 낮은 구간에 있으면 저평가, 높은 구간에 있으면 고평가로 판단하여 투자에 활용하기도 한다. 유용한 투자기법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2022년 들어 미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국내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시장 PBR이 1배 밑으로 추락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22년 9월 15일 금융위는 증권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자본시장연구원은 45개국 3만2428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05~2021년 16년간의 PBR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국내 증시 PBR이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태평양국가의 69% 수준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에 비해 매우 낮다고 발표하였다(2022.9월 자본시장연구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참조)
구체적으로 2012~2021년 10년간 PBR이 한국 1.16배, 싱가포르 1.19배, 홍콩 1.34배, 일본 1.44배, 독일 1.82배, 영국 1.93배, 대만 1.94배, 중국 2.24배, 인도 2.49배, 미국 3.10배로 나타났다.
3개 지역의 산술평균 PBR로 보면 국내 증시 PBR은 해외의 60% 수준이다.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국내 증시가 매우 저평가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현재 주가지수 2400p에 해외증시의 평균 PBR을 적용해 보면 4000p가 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저평가되어 2400선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다.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고 수긍하기 어렵다.
같은 논리라면 PBR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싱가포르, 홍콩, 일본의 주가도 상당히 저평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들 나라도 주가가 디스카운트되었다고 판단할까?

증권거래소는 2022년 5월 2일 종가 기준으로 2021년 결산 재무제표를 반영한 코스피200 지수의 PBR은 1.0배로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4.2배, 일본 1.3배, 영국 1.8배, 선진국 전체(23개국) 2.8배, 중국 1.3배, 대만 2.4배, 인도 3.9배, 신흥국 전체(24개국) 1.6배로 나타났다(MSCI 국가지수 2022년 4월 29일 종가 기준). 이 또한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통계 발표로 해석된다.
먼저, 순자산가치를 토대로 산정되는 PBR 지표는 과거 데이터에 불과하다. 시장은 계속기업을 가정하여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
같은 PBR이라 할지라도 미래 이익 성장성이 다르므로 시장에서 기업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익 성장성이 낮은 회사는 PBR이 낮지만, 성장성이 높은 회사는 PBR이 높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 17일 종가 기준으로 2022년 추정 PBR은 삼성전자 1.25배, 현대차 0.58배, 한전 0.27배로 낮지만, 성장산업인 2차전지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은 6.79배, 포스코케미칼은 7.25배로 매우 높다.
주가는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PBR 또한 계속 변동한다. 삼성전자 PBR은 최근 5년간 1.0~2.4배 사이에서 움직였으며 최근에는 1.4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애플은 과거 30년 동안 2~6배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20배를 상회한 후 최근에는 30~40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애플의 PBR은 왜 이렇게 높을까? 주가가 엄청나게 고평가된 것일까?
2021년 SK증권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초대형 일류기업과 혁신기업의 가치평가에 무형자산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특허, 브랜드 가치, 우수한 지배구조, 규모의 경제, 연구개발(R&D) 등의 무형자산은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옛 페이스북), 퀄컴, 시스코, 비자, 스타벅스 등 미국의 대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의 5대 기업에 대하여 1975년(IBM, Exxon, P&G, GE, 3M)과 2018년(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을 비교해 보면 유형자산은 6000억 달러에서 4조 달러로 6.7배 증가한 데 반해 무형자산은 1200억 달러에서 21조 달러로 무려 175배나 폭증했다.
재무제표에는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무형자산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 애플이 단순하게 PBR이 30배를 넘나든다고 해서 고평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조너선 해스컬의 <자본 없는 자본주의(Capitalism without Capital)>의 제목만으로도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역설하고 있다(2021년 SK증권 리서치보고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 참조).
시장에서는 무형자산 중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은 브랜드 가치를 특히 중시하고 있다.
인터브랜드(InterBrand)와 JP 모건(JP Morgan)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동 연구에 따르면, 브랜드 가치가 주주가치(shareholders value)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나타났다. 유형자산은 36%, 브랜드 이외의 무형자산은 26%로 브랜드 가치를 포함한 무형자산이 주주가치의 거의 3분의 2인 64%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2008, Patent 21 통권 78호, ‘브랜드 가치평가의 기준 및 효용성’ 참조).
세계 최대 규모의 브랜드 컨설팅 회사인 미국의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발표한 2022년 글로벌 브랜드 순위에 따르면, 애플이 1위로 브랜드 가치가 4822억 달러(약 609조원)며 미국 기업이 상위 20대 기업 중 15개를 차지하고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삼성전자(877억달러, 약 111조원), 토요타, 코카콜라, 메르세데스‒벤츠, 디즈니, 나이키 순이다. Brand Finance는 삼성전자를 6위로 평가한 반면, 전 세계 51개국 410만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한 영국계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회사 Kantar는 삼성전자를 의외로 낮은 44위로 평가하였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애플은 시가총액은 2조726억달러(약 2618조원), 순자산은 567억달러(약 72조원)로 PBR은 36.6배다. 시가총액에 비해 순자산이 너무 작고, 다시 말해 순자산에 비해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높다.
애플은 최근 10년간(2013~2022 회계연도) 5905억달러(약 673조원)의 누적 순이익을 거둬 배당으로 1294억달러(약 148조원), 자사주 소각으로 5532억달러(약 631조원)를 사용했다. 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이 115.6%로, 벌어들인 순이익을 자산으로 유보하지 않고 전부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사용했다(미국 자본시장 규제감독기관 SEC의 공시시스템 EDGAR 참조).
삼성전자는 최근 10년간(2012~2021 회계연도) 289.2조원의 누적 순이익을 거둬 배당으로 67.8조원, 자사주 매입으로 23.1조원을 사용하여 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이 31.4%를 나타냈다(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 DART 참조).
삼성전자는 엄청난 설비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IT 제조회사지만 애플은 제조는 아웃소싱하고 디자인과 설계에 중점을 둔 지식기반 플랫폼 회사다. 두 회사는 기본적으로 사업구조가 달라 PBR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미래 투자를 위한 이익 유보로 순자산(분모)이 커서 PBR이 낮다. 반면 애플은 제조 아웃소싱과 높은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작은 순자산(분모)으로도 경영이 가능하며,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엄청난 주주환원을 통해 주가(분자)를 견인하여 PBR이 높다.
삼성전자의 순자산(2022년 9월 말 335조원)은 애플보다 4.7배나 많지만 시가총액(330조원)은 애플의 12.6%에 불과하다. 반대로 애플의 순자산은 삼성전자의 21.5%에 불과하지만, 시가총액은 삼성전자보다 7.9배나 많다. 결국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PBR이 37배나 높다.
참고로 2023년 2월 20일 기준으로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PBR을 살펴보면 애플 42.6배, 마이크로소프트 10.5배, 아마존 6.8배, 구글 4.7배, 테슬라 14.7배, 엔비디아 24.7배, 유나이티드 그룹 5.7배, 비자 12.5배, 엑손모빌 2.3배, 메타 3.6배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PBR은 삼성전자 1.2배, LG에너지솔루션 6.3배, 하이닉스 0.9배, 삼성바이오로직스 6.7배, 삼성SDI 2.8배, LG화학 1.6배, 현대차 0.6배, 네이버 1.4배, 기아 0.8배, 포스코홀딩스 0.5배다.
국가별로 증권시장의 여건, 상장기업의 업종·성장성·수익성·배당성향,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무형자산의 가치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
분자인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고 있다. 게다가 ‘보이지 않는 세상(무형자산)’도 반영하고 있다. 분모인 순자산은 ‘보이지 않는 세상’은 반영되지 않는다. 주주환원이 많은 회사는 돈이 회사 호주머니(자산)에 있지 않고 투자자 호주머니에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된 PBR을 비교하여 우리 증시 PBR 수치가 해외증시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시가 저평가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단선적이고 타당성이 떨어진다.
전통적인 아날로그 지표인 PBR을 비교하여 주가 고평가·저평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음 글에서는 주가수익비율 PER를 기준으로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다. (4편에서 계속됨)
<최윤곤 전 금감원 국장 약력>
- 금융감독원 33년 근무
- 자본시장조사국장, 기업공시제도실장, 광주전남지원장, 금융교육 교수 등 역임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University of Texas(Austin) MBA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