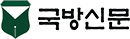외국인 투자자, 그들은 누구일까? 핫머니일까, 헤지펀드일까, 경영권을 노리는 기업사냥꾼일까, 한국이라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 가는 먹튀 세력일까?
국내 증권시장 동향을 보도하면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내용은 외국인이 얼마 사고 얼마 팔았다는 내용이다. 외국인이 주식을 대거 처분하여 주가가 급락했다거나 대량 매수하여 주가가 급등했다는 뉴스가 흔하게 나온다.
어떤 경우에는 핫머니라고도 하고, 헤지펀드 투기세력이라고도 하고, 한때는 달러 캐리 자금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분석이 난무했다.
1992년 외국인에게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을 개방한 이후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 외국인은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등 국내외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때마다 국내주식을 대거 처분하였다.
외국인은 지난 30여 년간 사고팔기를 반복하였지만, 꾸준히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여 올해 5월 말 현재 상장주식 696조 원, 전체 시가총액의 26.8%를 보유하고 있다.
주가지수가 최근에는 급락하였으나 그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투자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991년 말 611포인트(p)였던 국내증시 주가지수는 2022년 5월 말 현재 2686포인트(p)로 올랐다.
외국인은 다양한 투자그룹이다. 같은 날에도 매수하는 외국인도 있고 매도하는 외국인도 있다. 같은 종목에 대하여도 매수하는 세력도 있고 매도하는 투자자도 있다.
그들 나름대로 국내외 경제, 시장 동향,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전략에 따라 매매하는 것이다. 그들은 선한 투자자도 나쁜 투자자도 아니다. 쉽게 말해 전망이 좋으면 사고 안 좋으면 파는 것이다. 결국, 이익을 보려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다.
일부는 경제 전망과 관계없이 현물 바스켓(지수 구성 종목)을 사고 선물(옵션)을 팔거나, 현물 바스켓을 팔고 선물(옵션)을 사는 지수차익거래(index arbitrage)를 하기도 한다. 쉽게 말해 삼성전자 주식을 전망이 좋아서 사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그냥 차익거래를 위해 사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2010년 11월 11일 도이치은행이 장 종료 동시호가에 2조 4000억 원의 대량 물량을 내던져 주가가 급락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롱숏거래, 헤지거래, 스왑거래 등 외국인의 매매전략은 다양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체를 그룹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올해 5월 말 현재 국가별 국내주식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40.8%, 영국 8.4%, 룩셈부르크 6.5%, 싱가포르 6.5%, 아일랜드 4.4%, 다음으로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일본, 중국, 중동 국가들 순이다.
먼저, 최대 투자국은 역시 미국이다. 앞선 칼럼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세계 대부분의 자금을 주무르고 있는 미국의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우리나라에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과 교직원연금(CalSTRS) 등 연기금도 전 세계 분산투자 차원에서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BlackRock, Vanguard, Fidelity, State Street, Capital Group 등이 우리나라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와 ETF, 개도국에 투자하는 이머징 펀드, 전 세계에 분산투자하는 글로벌 펀드 등을 통해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BlackRock은 대표적인 ETF 브랜드인 iShares를 통하여, 구체적으로는 이머징 ETF와 한국 주식 전용 ETF를 통하여 국내주식에 상당한 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인덱스 펀드나 ETF는 주로 인덱스를 구성하는 대형 종목을 매매하는 패턴을 보인다. 펀드매니저가 경기전망에 따라 주식을 사고팔기도 하지만, 전 세계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의 매매(가입과 환매)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팔기도 한다.
과거 흐름을 분석해 볼 때 미국 투자세력은 경기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밀물과 썰물과 같은 중장기적인 매매행태를 보인다.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 투자세력은 2020년 16조 원, 2021년 7조8000억 원 등 2년간 23조8000억 원을 순매도하여 외국인 전체 순매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영국 투자세력은 전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 유수 투자은행의 런던 현지법인과 영국의 금융그룹이 주류를 형성하며, 일부 펀드와 연기금도 가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JP Morgan,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Merrill Lynch 등 미국계 투자은행(증권회사)의 런던 현지법인과 Barclays 등 영국계 금융그룹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들은 주로 런던 씨티 본부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지수차익거래, 공매도 투자, 스왑거래, 헤지거래, 장세 급변에 대응한 적극적 매매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비교적 단기 투자성향을 보이는 투자세력이다.
2020년 코로나 위기로 시장이 급락한 후 시장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대량 매수로 시장을 주도하기도 했다. 2020년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24.4조 원의 순매도를 보였으나 영국 투자그룹은 증시 상승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여 4조 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한편 2021년 이후에는 최근까지 약 13조원을 순매도하여 주식을 대거 처분하고 있다.
다음으로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의 경우 자국의 주요 금융그룹 투자자들이 아니다. 해외 유수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기관이 세제 혜택과 유연한 규제 때문에 이들 국가에 등록한 펀드다. 이들은 정통 뮤추얼 펀드와는 결이 다른 다양한 펀드들로 그 성격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한편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외에 전 세계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연기금, 국부펀드도 국내에 투자하는 중추적인 투자세력이다.
싱가포르, 노르웨이, 네덜란드,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주로 연기금, 국부펀드, 중앙은행 등 공적 자금으로 국내주식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중장기 투자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인덱스 종목에 투자하는 패시브 펀드 성격이 강하며, 직접 운용하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세계 유수 자산운용사에 일임하여 투자하기도 한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해외 유수 투자은행의 현지법인 데스크에서 활발한 매매를 보이기도 한다.
그 외 케이만 군도 등은 헤지펀드나 알고리즘을 이용한 퀀트 투자세력으로 매매가 빈번한 비교적 단기투자 성향을 보인다.
종합해보면, 외국인은 크게는 미국계 펀드·연기금과 싱가포르, 노르웨이, 네덜란드, 일본, 중국, 중동국가 등의 연기금·국부펀드 등이 중장기 투자세력으로 시장의 중장기적 흐름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축은 미국계 투자은행의 런던 현지법인과 유럽계 금융그룹들(쉽게 말해 증권회사 프랍데스크)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매매가 활발한 투자그룹으로서 시장의 단기적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이해하면 무방하다.
기타 케이만 군도를 위시한 조세회피 지역 펀드들은 단기매매나 퀀트 매매로, 매매가 빈번한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주류 투자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국제금융시장 주도세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국부펀드 등이 주류 세력이다. 그들은 세계 유수의 투자자들인 것이다.
물론 돈의 속성상 경기 상황에 따라 비교적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세력들은 세계 어디에나 있다. 또 투자은행 트레이딩 데스크는 원래 다양한 매매전략으로 빈번하게 사거나 팔거나를 한다.
가끔 국내 기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다. 소위 행동주의 펀드들로 외국인 가운데 그들은 소수이다. 주주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내는 투자자들도 있는 것이다.
국내 증시 개방 30년이 지났는데, 그간 국내 상장기업 경영권에 대한 악의적인 침탈은 거의 없었다. 문제를 제기하고 또 소송을 거는 일부 행동주의 펀드들이 있지만, 국내 언론이 민감하게 보도하여 부정적 인식이 커진 측면도 없지 않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의 또 다른 축인 채권투자는 2022년 5월 말 현재 226조원으로 전체 상장채권 잔액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투자금액의 80%를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보유잔액 179조원, 국채 상장잔액의 17.7%). 나머지는 거의 통안채(보유잔액 32조원, 통안채 상장잔액의 24.3%)와 특수채에 투자하고 있고, 회사채는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세력은 주로 중국,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호주 등의 중앙은행으로 외환보유고의 통화 다변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투자하는 나머지 투자그룹은 일부 국가의 국부펀드, 국제기구, 글로벌 채권펀드다.
예전 외국인 채권투자의 큰 축이었던 미국계 채권펀드는 대부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규모 자금의 유출입을 초래하는 단기매매 성향의 유럽계 은행 차익거래도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윤곤 전 금감원 국장 약력>
- 금융감독원 33년 근무
- 자본시장조사국장, 기업공시제도실장, 광주전남지원장, 금융교육 교수 등 역임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University of Texas(Austin) MBA 졸업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최윤곤의 스마트금융] 국제금융시장 주도세력은 누구?(3)
- [최윤곤의 스마트금융] 국제금융시장 주도세력은 누구?(2)
- [최윤곤의 스마트금융] 국제금융시장 주도세력은 누구?(1)
- [최윤곤의 스마트금융] 공매도, ‘공공의 적’인가? (1)
- [최윤곤의 스마트금융] 공매도, ‘공공의 적’인가? (2)
- [최윤곤의 스마트금융] 미 기관명 ‘일제 잔재’ 바로잡아야
- [최윤곤의 스마트금융] 재테크, 왕도는 없는가
- [최윤곤의 스마트금융] 리스크, 피할 수 없으면 이해해야!
- [최윤곤의 스마트금융] 환율, 누가 결정하는가?(1)
- [최윤곤의 스마트금융] 환율, 누가 결정하는가(끝)
- [최윤곤의 스마트금융] 주가, 누가 어떻게 결정할까(2)
- [최윤곤의 스마트금융] 주가, 누가 어떻게 결정할까(3)
- [최윤곤의 스마트금융] 주가, 누가 어떻게 결정할까(5)